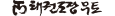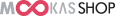[국선도 이야기] 권진인(權眞人)과 남궁두
발행일자 : 2012-12-14 16:22:53
<글. 정현축 원장 ㅣ 국선도 계룡수련원>


정현축의 국선도 이야기 35
 권진인(權眞人, 1069~?)의 본명은 권청(權淸)으로 고려 때 사람이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 500년 이상 살면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권진인(權眞人, 1069~?)의 본명은 권청(權淸)으로 고려 때 사람이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 500년 이상 살면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태어나기는 안동 권씨 상락대성(上洛大姓)의 자손인 태사공(太師公) 권행(權幸)의 증손으로 태어났는데, 문둥병이 생겨 부모가 죽은 자식으로 치고 숲속에 내다버렸다고 한다.
밤이 되자 호랑이가 권진인을 물어다가 굴속에 갖다 놓았는데, 무서움이 극에 이른 권진인은 차라리 빨리 잡아먹히기를 바랬다. 그러나 호랑이는 권진인 옆에서 새끼 두 마리에게 젖을 빨릴 뿐, 권진인을 해치려는 기색이 없었다.
그제사 권진인이 굴 속을 둘러보니 풀 넝쿨이 바위틈에 뻗어 있었는데, 잎이 넓고 뿌리는 굵은 게 먹을만해 보였다. 그것을 먹으며 몇 달을 지내다보니 온몸의 창(瘡)도 차츰 낫고, 혼자 일어나 움직일 수도 있게 되었다.
권진인은 더 열심히 뿌리까지 캐 먹다보니 온 산의 반쯤을 다 파제꼈다. 날짜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문둥병이 완전히 나아 딱지가 떨어졌으며, 몸은 저절로 나아 산마루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몸이 나았기에 고향에 돌아가려 하였으나, 어디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한 중이 산 밑을 지나가는 게 보이므로, 쫓아가서 길을 막고 물었다.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태백산이요. 땅은 진주부(眞珠府)에 속하였소.”
“가까운 곳에 절이 있습니까?”
“서쪽 봉우리 밑에 난야(蘭若)라는 암자가 있지만, 길이 험해서 올라갈 수가 없을 거요.”
권진인은 중의 말을 듣고 즉시 뛰어올라가 암자를 찾아가니, 암자는 낮인데도 문이 잠겨 있었고 사람 기척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직접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 행랑을 지나 중랑으로 들어가니, 한 늙고 병든 중이 베옷을 입고 이불을 덮은 채 안석에 기대 누웠다가 가만히 눈을 떴다.
“어제 밤 꿈에 한 노인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법(秘法)을 전수받을 사람이 곧 올 것이다.’ 하더니 너의 관상을 보니 참으로 그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노인은 힘들게 몸을 일으켜 함 속을 열고 책을 내어 주었다.
“이 책을 만 번 읽으면 자연히 그 뜻을 알게 될 터이니, 무쪼록 게을리 하지 말라. 나는 이제 떠나겠다.”
말을 마치자 노인은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고, 권진인은 다비(茶毗)로 화장(火葬)해서 사리를 탑 속에 모셨다.
권진인은 그 암자에 남아 노승이 남겨준 책을 보며 혼자 수련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사방에서 와 둘러쌌으나, 들은 체도 본 체도 않으니 모두 저절로 사라졌다. 이렇게 11년의 공부 끝에 신태법(神胎法)을 이룰 수 있었다.
공부를 이룬 권진인은 하늘에 올라가 상제(上帝)의 명을 받고, 치상산(적성산)에 머물며 동국삼도제신(東國三道諸神)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렇게 치상산에 머문 지가 벌써 오백년이었다.
수백 년 동안 권진인은 수많은 제자들을 겪었다. 그 가운데는 기(氣)가 과민한 사람, 혹은 너무 둔한 사람, 혹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 혹은 인연이 천박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 등등이어서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만일 성도(成道)하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할 일을 그에게 맡기고 옥경(玉鏡)으로 돌아갈 터였다. 그러나 긴긴 세월을 두고도 아직 한 사람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권진인의 진세인연이 다하지 않은 때문일 것이다.
한편 남궁두(南宮斗)는 1555년(명종10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지만, 살인죄를 짓고 도망하여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권진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주 치상산에서 권진인을 찾아 헤맨 지가 벌써 한 해가 다가고 있었다.
새도 날아갈 수 없는 층암절벽까지 다 뒤지며 벌써 여러 차례 찾았지만, 아직도 못 찾고 있었다. 그러다 소나무 잣나무가 햇빛을 가리우는 곳에 초가삼간 하나를 발견했다. 초가삼간은 절벽을 의지하고 지었는데, 돌을 쌓아서 토대로 삼은 집이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마른 나무같은 용모를 한 노승이 다 떨어진 장삼을 걸치고 나왔다.
“풍신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었소?”
“노사(老師)께 배우고자 한 해 동안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야 겨우 뵙게 되었습니다.”
“산속에서 다 죽게 된 늙은이가 무슨 재주가 있어 남을 가르치겠소? 그만 내려가 보시오.”
노승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남궁두가 뜰아래 엎드려 몇 날 며칠을 백배 애걸하자 그제서야 정성에 감응되었는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였다.
남궁두가 방안에 들어가 보니 방의 크기는 사방 한 길쯤 되는데, 다만 목침 한 개가 놓여 있었다. 북쪽으로는 땅굴이 6개 있는데 자물쇠로 잠갔으며, 숟가락 한 개가 굴 기둥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남쪽 창문 위에 달아놓은 선반에는 5~6권의 책이 있었다. 권진인은 남궁두를 한참 다시 보더니, 웃으며 말하였다.
“너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다. 가식이 없고 순박하니,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마. 대개 모든 방술은 먼저 정신이 통일된 뒤에야 이룰 수 있는 법. 더구나 혼백(魂魄)을 연단(煉丹)하고 정신을 비월(飛越)하여 신선(神仙)이 되려는 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정신통일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잠을 자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궁두는 첫날밤을 앉아서 버텼다. 사경(四更)이 되니 눈이 저절로 감기나 억지로 참고 밤을 새웠다. 이튿날 밤에는 몸과 마음이 피로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나, 마음을 다잡아먹고 억지로 참았다. 사흘밤 나흘밤이 되니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로 벽을 들이받아 가며 억지로 참았다.
이레째 밤이 되니 몽롱한 가운데 무슨 보자기를 훌렁 벗는 느낌이 나더니, 환하게 무엇이 깨달아지는 것 같으며 기분이 상쾌해졌다. 노승이 기뻐하며 또 일러 주었다.
“무릇 신선 되기를 배우는 자는 잡념을 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정·기·신(精·氣·神) 삼보(三寶)를 통일하여 감리용호(坎离龍虎)가 서로 섞여 단(丹)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연단술(煉丹術)의 첩경이다. 우선 먼저 곡식을 먹지 않는 벽곡(辟穀)에 들어가자.”
남궁두는 끼니를 점점 줄여나가다가 나중에는 검은콩 가루와 황정설(黃精屑)을 먹었는데, 3·7일이 지나자 홀연 배가 부른 것 같으면서 음식 생각이 없어졌다. 또 참깨와 솔잎을 100일 동안 먹으니 살갗이 고와졌다.
노승은 남궁두에게 수식법(數息法)과 운기법(運氣法)을 가르쳐 주었다. 마침내 자오묘유(子午卯酉) 사방을 향하여 육자비결(六子秘訣)의 호흡을 하니, 도(道)가 통하여 얼굴빛이 점점 윤기가 돌고 기분이 상쾌해지며 오만가지 잡념이 사라졌다.
“너는 도골(道骨)이 되었으니 이 도법(道法)으로 마땅히 신선이 될 것이요, 이대로 하산 하더라도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물욕이 움직여도 이를 참아야 한다. 모든 생각이 비록 식색(食色)이 아니라도 일체의 망상은 수련에 모두 저해되는 것이다. 모름지기 공(空)에서 고요함(靜)이 있으니 공으로서 수련을 쌓아야 한다.”
남궁두가 배운대로 승강(昇降) 전도(顚倒)의 법과 구결(口訣)을 정성껏 수련하며 앉아 있는데, 하루는 입천장에서 작은 자두만한 것이 생기는 듯하더니 단물이 혀에 부어졌다. 남궁두는 그것을 천천히 삼켜 배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수련을 쌓은 지 여러 해가 지나자, 단전(丹田)이 가득차고 황금빛이 배꼽 아래에서 번쩍이는 듯했다. 남궁두는 도(道)가 성취되어 가는 것이 기뻐, 좀 더 빨리 이뤄보려는 욕심이 생겼다. 그러자 누렇게 피어오르던 황화(黃花)가 차녀리화(姹女离火)를 제압하지 못하여 불길이 올라가 니환(泥丸)을 태우니, 남궁두가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다.
노승이 지팡이로 머리를 치며 말하기를 “아쉽구나, 이제는 틀렸다.” 하고 남궁두를 앉혀 화기(火氣)를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소차(蘇茶)를 먹이니, 겨우 마음이 안정되고 화기도 가라앉았다.
“너는 인연이 없어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으니, 그만 산을 내려 가거라. 황정(黃精)을 먹고 북두성을 경배하여 살생과 간음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지상선(地上仙)은 될 것이다. 행하고 수련하기를 쉬지 않으면, 천상선(天上仙)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마음을 닦는 요결은 오직 속이지 않는 것이 으뜸이니, 모든 사람의 한순간의 선악(善惡)도 귀신이 전후좌후에서 다 보고 있다. 옥황상제는 어디서나 강림하여 보시니, 굴속에서 홀로 조그만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북두궁(北斗宮)에 알려져 보응의 효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창창한 하늘 위에 천지의 주재자가 계심을 모르고 두려워 할 줄 모른다. 너는 비록 참을성이 있으나, 욕심이 없어지지 않았다. 만일 삼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길로 빠져 영겁의 고초를 겪을 것이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스승님의 가르침을 감당치 못하였으니, 제 운명이 박함이라 무엇을 한탄하겠습니까?”
남궁두는 마지막으로 스승의 단전을 한번만 보기를 소원하자,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무엇이 어려울 것 있겠느냐. 다만 네가 놀랄 것이 두려울 뿐이다.”
노승이 배 덮개를 벗기자 금빛 광채 백여 줄기가 지붕과 벽으로 내쏘이는데, 남궁두는 눈이 부셔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책상에 엎어졌다. 그러자 노승이 도로 배를 가렸다.
결국 남궁두는 7년 만에 스승께 작별인사를 하고 하산하였다. 그러나 하산을 하여 가정을 이룬 후에도, 치상산 가까이에 살면서 수련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무신년 가을, 조선시대 현종(顯宗) 때의 문인(文人) 홍만종(1643~1725)에게 찾아와 자신이 체험한 모든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다.
남궁두는 당시 83세였는데 마치 40대의 용모처럼 보였으며, 시력이나 청력, 정력이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난새(鸞)의 눈동자와 검은 머리털은 소연(소然)하여 마치 마른 학과도 같았다고 한다.
홍만종은 남궁두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해동이적(海東異蹟)》에 그대로 실어 놓았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다.
한편 《홍길동전》의 작가인 허균(1569~1618) 역시 남궁두를 만난 적이 있었다. 한눈에 이인(異人)임을 알아본 허균은 남궁두에게 같이 하룻밤을 묵기를 청하여, 그의 수련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그리하여 소설《남궁선생전》을 탄생시켰다.
같은 소재를 가지고 홍만종이 전기(傳記) 형식으로 썼다면, 허균은 소설로 쓴 것이다.
* 알림 : 편집팀의 내부 사정으로 <국선도 이야기> 연재가 한동안 연재가 안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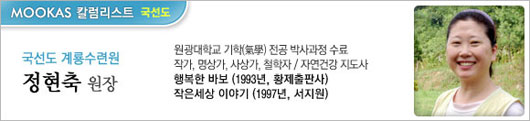 * 위 내용은 외부 기고문으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외부 기고문으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글 = 정현축 원장 ㅣ 국선도 계룡수련원]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작성하기
-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선님! ^.~
2012-12-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재미 있습니다.그런중에도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원장님은 얼마나 많은 독서를 하셨는지 참 존경 스럽습니다.
2012-12-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저도 여러가지 많은 반성을 합니다. 저야 .. 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 스승님께 좀더 착한 제자가 되고싶습니다.. ^^*
2012-12-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정원장님 좋은글 매번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20일 투표 결과를 보고.개인이나 사회생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게, 참 힘든 일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개인의 수련에서도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히거나,,미래의 수련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이를 핑게로한 게으름이 일상화되는것을 반성합니다.
2012-12-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누가 될까여?
2012-1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투표 하셨습니까?
2012-1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재미슴돠,,, 홍길동전의 허균도 남궁선생전을 썼군요! ㅎㅎ
2012-12-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그렇군요 !
2012-12-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팽조의 장수비결 !!
1. 수신修身 2. 양성養性 3. 좋은 생활습관 4. 절제
2012-12-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공자와 장자의 저서에서도 모두 팽조를 장수長壽의 표상으로 삼고 있으며, 진晋나라의 의학자 갈홍葛洪이 쓴 《신선전(神仙傳)》은 팽조를 위하여 지은 저서라고 한다.
2012-12-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침착한 성격으로 조용한 것을 좋아하며 본성을 배양하여 장수를 누리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한 팽조(彭祖)는 하·은·주 시대에 820살까지 수명을 누렸다고 중국 다수의 역사서에는 기록하고 있다. 그들 기록에 의하면 팽조의 성은 전籛, 이름은 갱鏗으로, 오제五帝 중 한명인 전욱颛顼황제의 손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향은 사천성四川省 메이산眉山 펑산쩐彭山镇이라고 한다.
2012-12-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사람이 500살까지 사는 게 가능할까여 ?
2012-12-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2012-12-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0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